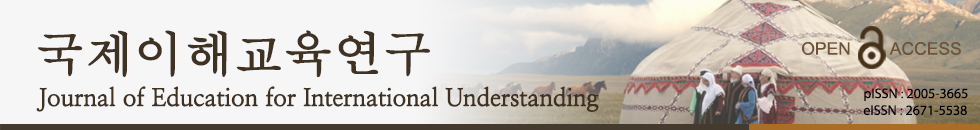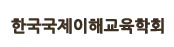아주 화창한 1997년 5월, 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다. 국제이해교육 아시아태평양지역 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연구에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다. 국제이해교육이란 용어 자체의 낯설음은 물론이고 해외 연구진들과 영어로 한달간 공동논의하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데 대해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자기들을 믿고 참여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수락한 것이 이후 내가 국제이해교육에 몰입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1988년 한신대교수가 되어 주로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교육운동을 논했던 한편, 1995년부터는 교사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함께 평화교육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탐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네스코기관에 대한 이해는 일천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정치적 지형 변화 속에서 아태교육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연구에 참여하고 이후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국제이해교육의 이론적 자리매김을 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은 것 자체가 내게는 영광이고 지적 성장의 계기로 작용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한다.
1998년 김대중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에서 2000년 8월 아태교육원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근3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주관부서였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타당성연구를 확산하고 지원세력을 넓히기 위해 아태지역 관계자회의를 자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년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를 설립하였다. 그런 면에서 국제이해교육학회는 유네스코한위가 아태교육원 설립을 위해 방향도 설정되지 않고 학회로서의 면모도 준비되지 않은 채 유네스코 주변 인력을 끌어들여 소위 국제이해교육 관련인사들을 망라하여 만든 다소 관변적 성격의 학회로 시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내용은 아주 진지해서, 세계화의 맥락에서 국제이해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세력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였다. 그래서 국제이해교육은 교육학, 지역학, 국제관계학 및 인류학 등 이른바 다학문적 접근을 해야 하는 사회과학의 일부로 규정하면서 학회도 교육학과 주변학으로 이원화하여 회장도 교육학과 관련학 교수들이 번갈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피력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성문화된 틀은 없이 합의적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한위에 사무국을 두고 출발한 다분히 비공식적 성격의 학회는 아태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두기 위해 아태교육원 설립 전에 1999년 창립되었고 다음 해 2000년 아태교육원이 설립된 이후에는 사무국도 아태교육원이 맡고 학회도 아태교육원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초대 김신일회장체제는 그렇게 한위와 아태교육원이 학회의 진행과 절차를 준비해주고 운영해주었다.
학회의 형식적 기반을 세운 후 2대 회장으로 정두용박사님이 취임하였다. 한동안 아태교육원이 모든 학회운영을 주관해 주었으나, 3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학회독립을 추진한 정두용회장은 학회지를 독자적으로 발간하였고 학회총회를 아태교육원 사무국의 도움 없이 학회자력으로 개최하였다. 학회는 월례회 뿐만 아니라 일본국제이해교육학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시작하였다. 6월에는 일본 학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11월에는 우리 학술대회에 일본과 중국이 참여하면서 학회의 아시아적 지평을 넓혀나갔다. 한, 중, 일 공동 연구도 시작하였고 교차적으로 학술대회에 서로를 초청하면서 국제이해교육의 국가간 상이성과 공통성에 대한 논의도 발전시켰다. 지금까지 이러한 국제교류는 타 학회가 부러워하는 국제교류의 성과이다.
한국사회의 학계 흐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으로, 학회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학술지가 반드시 연구재단 등재지가 되어야 했다. 기실 학회지에 기고된 글의 수준이나 편수나 상당히 편중되고 미약했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학진 등재지가 되어야 했다. 다행히 한경구회장의 지속적인 학술지 발간지원 덕분으로 미등재지였음에도 한번도 거르지 않고 학술지가 발간되었고, 강순원회장 시기에 학술지가 등재후보지가 되었고 한건수회장 재임 때 등재지로 승격되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인용지수도 결코 타 학술지에 뒤지지 않는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 유철인, 김현덕, 이경한, 김다원 편집위원장의 노고가 컸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본래 학회란 연구공동체이다. 국제이해교육학회는 타 학회와 달리 현직 교사들의 실천력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대단한 우리 학회만의 자산이다. 국제이해교육의 이론과 실천이 학교라는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놀라운 학술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면이 많다. 무엇보다 대학교수들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이론적 탐색 수준이 발전되지 않는다는 면이다. 더구나 유관 개념인 다문화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 혹은 지속가능발전교육 등과 혼재되면서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적합한 사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 세계시민교육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달 목표(SDG)로 부상되면서 지금은 거의 국제이해교육이 실종된 상태이다. 오늘날 세계시민성이라는 인류애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권신장과 평화구축을 위한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이 강조되는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시민교육과 더불어 함께 강조되어야 하는 여전히 시의적절한 주제이다. 이를 위한 학술적 고투에 모두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우리 학회는 ‘모두를 위한 국제이해교육’을 학회 정회원들이 참여하여 발간하였고 이는 문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또한 일부 학회원들이 연구재단으로부터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제이해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다 더 발전된 실천적 연구가 진행되고 또 관련 학술도서도 지속적으로 발간되기를 희망한다.